“제가 삼성보다 부자라고요?”… 믿기 힘든 통계에 서민들 ‘황당’, 대체 무슨 일이?
||2025.03.31
||2025.03.31

“이게 말이 되냐. 내가 대기업보다 세금을 더 냈다고?”
직장인 김모 씨(34)는 최근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지난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만 380만 원이었다.
그러나 뉴스를 통해 많은 기업이 작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으며, 삼성전자가 2년 연속 법인세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다.
김 씨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며 “내가 수많은 대기업보다 세금을 더 낸 건가 싶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김 씨처럼 세금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법인세 감소로 인한 세수 부족을 개인 소득세로 메우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납세 형평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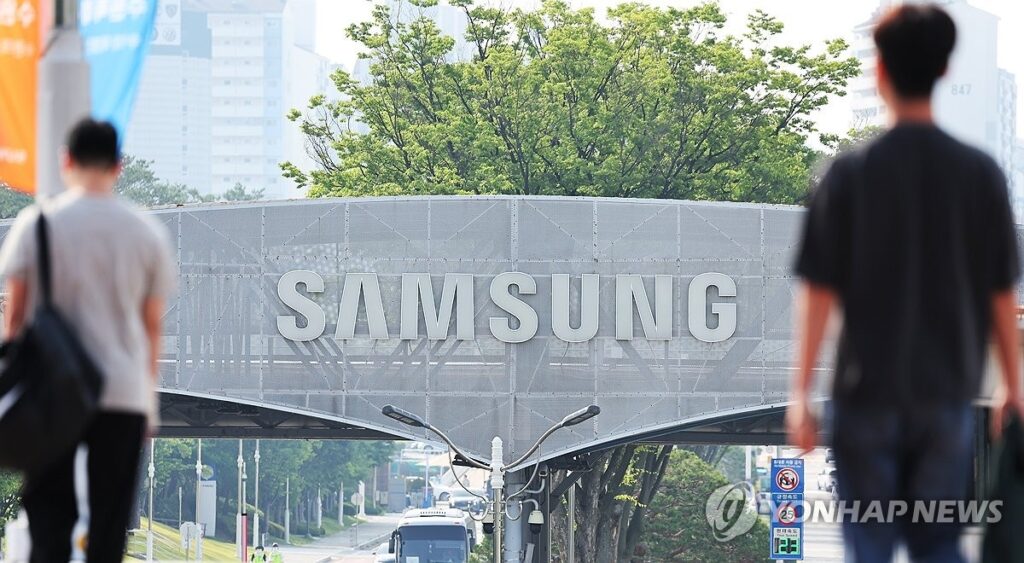
한때 연간 6조 원 가까운 법인세를 납부했던 삼성전자가 올해는 1조 원도 채 내지 않을 것이란 정부 추산이 나왔다.
지난 21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제 항목 등을 따져보면 사실상 최저한세율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적자 영향으로 법인세 납부액이 ‘0원’이었고, 이는 197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이월결손금과 각종 세액공제로 인해 법인세가 대폭 줄었다.

삼성전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역시 법인세 비용이 ‘-1조 8329억 원’으로 기록되어 있어 법인세를 내지 않을 확률이 높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 수입을 전년보다 26조 원 많은 88조 원으로 전망했지만, 핵심 납세자인 삼성전자의 실적 저조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가 지난해 2조9700억 원의 법인세 부채를 기록하며 일부를 메우긴 했지만, 전반적인 수입 부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문제는 대기업의 세금은 줄고 있는 반면, 개인 소득세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 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근로소득 증가율을 앞질렀다. 실질 소득은 줄었지만 세금은 더 냈다는 뜻이다.
실제 근로소득세는 2014년 25조 원에서 지난해 61조 원으로 2.4배 넘게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법인세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세금은 오르는데 생활은 팍팍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대로 가면 서민만 세금 메우는 구조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세수 예측의 정확도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61조 원, 57조 원이 초과 징수됐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반대로 56조 원, 30조 원씩 덜 걷히는 ‘세수 펑크’가 났다. 이 같은 불안정성의 핵심 원인은 법인세 중심의 조세 구조다.
기업 실적이 좋을 땐 세수가 넘치지만, 반도체 업황처럼 일부 산업이 부진할 경우 세수 전체가 흔들린다. 여기에 정부의 감세 정책이 더해지면서 세수 기반이 더욱 약해졌다.
올해 전체 정부 지출 중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10.3%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세 감면율도 15.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조세지출 증가가 직접적으로 세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감세를 추진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크지 않다”며 “감세 일변도의 조세정책은 결국 일반 국민들의 세금 부담만 늘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법인세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는 한두 개 대기업의 실적 변화에 따라 세수 전체가 요동칠 수밖에 없다”며 “유럽처럼 경기 민감도가 낮은 소비세 비중을 높이는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올해 세입 여건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상대적 납세 부담이 계속해서 커지는 만큼, 실질적이고 균형 잡힌 세제 개편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